㈜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순결한 언어의 등불: 윤동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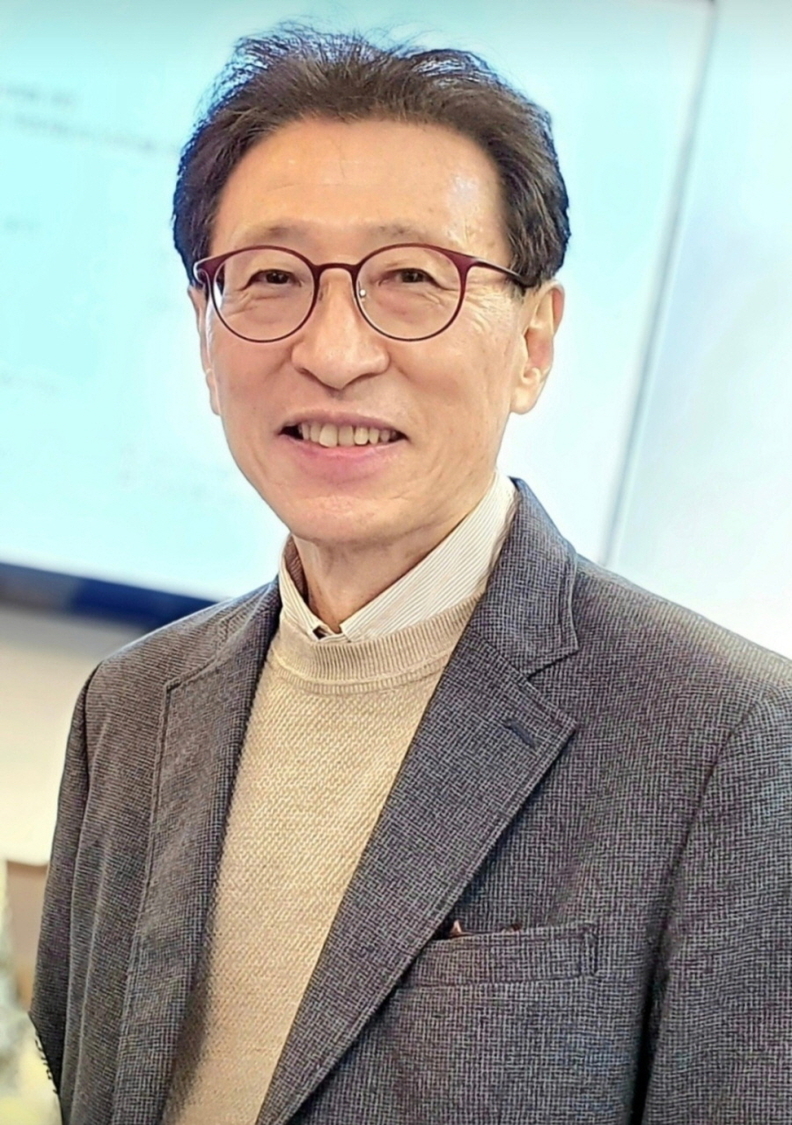
김부조(시인칼럼니스트)
한 시대의 문학은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일제감정기의 암울함 속에서 가장 맑고 조용한 목소리로 시대를 건너간 시인이 있다.
바로 윤동주(1917~1945)다. 만주 북간도의 명동촌에서 성장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언어의 훈란을 체감했다.
그 엄혹했던 시절. 학교에서는 일본어가 강요되고 조선의 이름과 말은 지워져 가고 있었다. 그가 '말'과 '이름', '빛'과 '그림자'를 반복적으로 다룬 것은 정체성에 대한 예민한 감각에서였다. 일본 유학
시절에는 식민지 청년의 무력감과 죄책감을 깊이 체험했고. 그것은 "참회록“과 같은 내면 고백의 시편으로 이어졌다. 윤동주의 문학 세계는 외부의 억압과 내부의 성찰이 겹겹으로 포개진 자리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서시'., '별 헤는 밤', '자화상' 등 한국인의 정서를 김이 담은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서시'에서는 스스로에게 정직할 것. 타인에게 친절할 것을 다짐하며. 시대의 억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간적 소망을 드러낸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4셨)과/ 별 하나에 시와/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윤동주 [별 헤는 밤] 중에서)
1941년. 산문 형식으로 지어진 별 헤는 밤.에는 어린 시절의 애투한 추억을 되새기며 조국의 광복을 간절히 염원하는 열망이 담겨 있다. 시인은 가을밤을 배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으로 표현했다.
도도한 물결과도 같은 내재율을 지니고 있어 읽는 이와 듣는 이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유동주의 시를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서정성'과 '순수함'을 말한다.
그러나 그의 순수함은 현실을 외면한 무구한 감정이 아니라, 치열한 성찰 끝에 도달한 윤리적 결단에 가깝다.
서시에서 그는 밤하늘의 별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기원했다. 이는 시대가 요구하는 도덕적 긴장을 자신에게 먼저 겨눈 선언이었다. 불의가 일상이 되고. 침묵이 생존의 조건이던 시절에 '부끄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저항의 첫걸음이었다.
오늘날 윤동주가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는 그의 시가 '윤리적 감수성'을 잃은 시대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그가 남긴 가장 단순한 문장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는 시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의 감정이다.
윤동주의 시는 거대한 영웅 서사가 아니다.
작은 목소리로도 시대를 비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조용한 증언에 가깝다. 그의 시를 읽고 있으면, 한 청년이 '바르게 살고자' 했던 고독한 노력의 흔적이 우리 마음을 일으킨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세계를 살아가지만, 그가 남긴 등불 같은 문장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조금 더 선한 방향으로 이끈다
일본 유학 중이던 스물여덟에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으로 2년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투옥된 그는 이듬해 옥사했다.
사인은 '병사로 기록되었으나, 생체 실험의 피해라는 증언이 이어지며 그의 죽음은 시대 폭력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불운한 결말은 오히려 그의 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삶은 짧았지만 그의 시는 더욱더 길게 미래로 뻗어나갔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기억하게 했다.
비록 그의 언어는 작지만, 그의 빛은 오래 남을 것이다. 자신의 생전에 단 한권의 시집도 온전히 펴내지 못한 채 스물아홉의 나이로 생을 마쳤지만, 그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선명한 빛으로 남아 있다.
순국 80주기를 맞아 윤동주를 재조명하며, 시대가 새로워져도 왜 그의 시를 다시 읽어야 하는지 이제 그 물음에 답해야 할 때다







